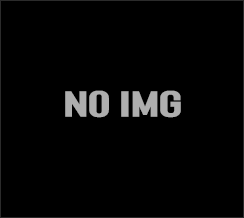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위기의 한국영화] ③ 대작 쏠림 패러다임 벗어나야

영화 ‘히트맨2’는 85억원의 제작비로 254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손익분기점 돌파에 성공했다. 전작인 ‘히트맨’(240만명)보다 흥행 성적은 더 좋았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한국 영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허리급’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 대규모 투자나 소위 ‘흥행 대박’에 대한 부담이 적어 소재나 장르 등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적은 예산을 들인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사례가 계속되면 업계에 자본 순환이 이뤄지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기준 ‘허리급’ 영화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순제작비 100억원 미만의 영화를 일컫는다.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명대 관객을 모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규모다. 팬데믹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30일’(2023), ‘핸섬가이즈’(2024), ‘파일럿’(2024), ‘히트맨2’(2025) 같은 영화가 이에 해당한다.

중간급 영화들은 장르 면에선 액션 블록버스터보다는 주변 일상의 모습이나 기발한 상상에서 착안한 코미디물이 많고, 캐스팅도 수억대 개런티의 ‘톱스타’들보다 개성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주·조연급의 배우들로 구성돼 있다.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간급 영화는 중요하다. 중소 규모 영화가 사라지면 훗날 대작을 만들어낼 감독들이 입봉할 기회도 사라져 한국 영화의 미래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거란 우려가 계속된다. ‘포스트 박찬욱’ ‘포스트 봉준호’가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다.
멀티플렉스 한 관계자는 8일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웰메이드’ 영화를 만드는 것밖에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관객들이 극장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제작비가 급증하고, 관객들은 캐스팅이 화려한 블로버스터급 영화가 나와야 그나마 눈길을 준다는 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팬데믹 이전 ‘허리급 영화’는 제작비 70억원 미만인 작품들을 통칭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기준 중급 영화라 하더라도 이제는 100억원 미만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재원은 한정돼 있고, 캐스팅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흥행 가능성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한다면 중간급 영화 여러 편보다는 텐트폴 한두 편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성공한 영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유럽에선 관객 수 100만도 성공한 건데 한국에선 500만명 모으면 실패라고 한다. 접근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며 “순제작비 50억원 안팎의 영화가 많아져야 하는 동시에 투자사들이 ‘많이 투자하고 많이 얻어가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성공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가 성공했느냐의 기준은 ‘1000만 관객’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넘겼는지 여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높고 인력도 OTT로 향하는 반면 극장 관객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며 “수백억 투자한 작품을 ‘1000만 영화’ 만들려고 스크린을 독과점하면 다른 영화가 기회를 못 얻고, 업계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작비를 현실화해서 영화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몸집을 줄이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세정 정진영 기자 fish81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여수짱똥깨
여수짱똥깨
 1600
1600
 곽가봉효
곽가봉효
 1500
1500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1500
1500
 우로스써보세요
우로스써보세요
 1400
14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