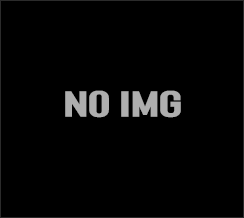중국 헤이룽장 이란 충돌구 생성 비밀 규명
운석 충돌구, 동북아엔 3곳뿐
충돌 당시 매머드 살아...생태계 큰 영향

중국 헤이룽장성에 발견된 이란 충돌구는 지름이 약 1.85㎞로, 지난 10만년 동안 생겨난 충돌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NASA
지난 2021년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이란현에서 오래전 운석이 충돌하면서 생긴 충돌구가 발견됐다. 중국에서 운석 충돌구가 발견된 것은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슈엔 충돌구 이후 두 번째다. 동북아시아에서 운석 충돌구가 발견된 것은 두 충돌구와 지난 2020년 경남 합천 적중면과 초계면에서 확인된 충돌구를 포함해 3개에 이른다. 충돌구가 형성된 과정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과 이탈리아, 미국 과학자들이 이란현에 떨어진 운석이 최근 8만년 동안 지구에 떨어진 운석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중국과학원과 이탈리아 단눈치오대,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진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커뮤니케이션 지구와 환경’에 이란 운석 충돌구의 3차원 구조와 충돌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우주를 떠돌던 작은 소행성이나 운석이 지구에 부딪힐 때 생긴 충돌구는 태양계와 지구 탄생의 신비를 담은 매혹적인 지질학적 지형을 형성하며 과학자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충돌구는 207개, 소행성 충돌 흔적이 남아 있는 퇴적물은 43곳에 이른다.

이란 충돌구의 위치 및 개요. a) 이란 충돌구 위치 지도. 이 분화구는 헤이룽장성 중남부에 위치해 있다. b) 이란 충돌구 위성 사진. 남쪽으로 넓은 틈이 있고 분화구 바닥에 원형으로 함몰된 분화구 가장자리를 보여준다.(2013년 12월 촬영). 구글 어스에서 촬영. c) 2019년 6월 무인 항공기가 지상 500m 고도에서 촬영한 분화구 밖 남동쪽의 파노라마 전경. 그림 1의 별은 중국의 수도를 나타낸다.
충돌구는 지구 깊숙한 곳에서 초고온과 초고압 환경에서 암석과 광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 맨틀 속 암석은 샘플을 얻기 쉽지 않다. 하지만 소행성이나 운석이 부딪힐 때 발생한 극한의 온도와 압력은 맨틀 깊숙한 곳에 있는 암석과 비슷한 광물을 순간적으로 생성한다. 또 운석이 충돌할 당시 살던 생물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란 충돌구는 지난 2020년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이전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충돌구는 랴오닝성의 충돌구가 유일했다. 인근 주민들은 처음에는 충돌구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일찍부터 이 움푹 패인 충돌구를 가리켜 취산(원형 산줄기)이라고 불러왔다. 이 충돌구는 지름 1.85㎞로, 지난 10만년 내 발생한 충돌구 가운데 가장 크다. 연구진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숯과 호수 퇴적물의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3000년 전에서 4만6000년 전에 충돌구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견된 배링거 충돌구는 5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름은 1.2㎞로 이란 충돌구보다 작다.
충돌구는 초승달 모양의 분화구 형태를 띠고 있다. 북쪽 가장자리는 바닥에서 150m가량 솟은 상태로 잘 보존됐지만 충돌구 남쪽 3분의 1은 사라진 상태다. 이런 모습은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을철 북쪽 가장자리 경사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단풍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충돌 과정과 지하 구조 특성은 최근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연구팀은 충돌구 내 220개 지점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구조를 연구했다. 고밀도 지진계 배열을 기반으로 한 수동 소스 이미징 방법이라는 분석 기술을 사용했다. 연구진은 운석 퇴적물과 충돌 때 생긴 암석이 생성한 원형 충돌구를 확인했다. 또 충돌구 아래에서는 깊이 275~315m인 3차원 그릇 모양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했다.

a) 이란 충돌구 아래의 3차원 속도 구조. b) 운석 충돌 사건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을 보여주는 모식도. 이 지역에서 4만8000년 전의 포유류 화석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충돌구가 형성될 때 충돌 속도와 운석의 지름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충돌구가 형성될 때 충돌 에너지는 약 24메가톤(Mt)으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1600배에 이른다. 이는 규모 5.5에 해당하는 지진과 맞먹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최근 8만년간 생긴 다른 충돌구와 비교해 보면, 이 기간에 발생한 가장 큰 충돌 사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4만8000년 전부터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 화석이 발견됐다. 충돌 지역에 이들 포유류가 많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추 샘플에서는 이 지역이 초목이 무성했을 것을 뒷받침하는 숯 파편도 발견됐다. 당시 생태계가 대형 포유류에게 적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운석 충돌이 당시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석은 비교적 최근에 충돌했지만 운석과 충돌한 화강암은 훨씬 오래전인 약 2억년 전 초기 쥐라기 시대에 형성됐다. 중국과학원과 오스트리아 빈대 연구진은 2021년 국제학술지 운석 및 행성에 분화구 중심부를 438m 깊이로 시추한 결과 수백 미터 깊이의 고대 호수 퇴적물과 부서진 화강암을 발견했다. 이 구조물이 실제로 충돌 분화구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충격을 받은 석영과 녹은 화강암, 기포로 형성된 구멍이 있는 석영, 눈물방울 모양의 유리 파편이 발견됐는데 모두 강력한 운석 충돌 사건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높이 200~600m 산들에 둘러싸인 경남 합천군 적중·초계분지의 모습. 적중·초계분지는 5만년 전 지름 200m에 달하는 운석이 떨어져 만들어진 분지로, 직경 약 7㎞ 규모의 크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질연구센터 연구팀의 조사로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임이 확인됐다. /조선일보DB
연구진은 지금도 충돌구 남쪽 가장자리가 사라진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분화구 안쪽에 호수 바닥 퇴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장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퇴적물은 비옥한 유기물 토양을 형성했다. 실제 분화구 남쪽 부분에선 농경지를, 나머지 부분은 늪지대와 삼림 습지로 덮여 있다.
운석 충돌구는 북미와 남미, 유럽, 아프리카, 호주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선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2010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처음 운석 충돌구가 발견됐고 2020년 경남 합천에서 두 번째 충돌구가 발견됐다. 당시 연구진은 지름이 약 7㎞인 적중초계분지에서 깊이 142m 시추코어 조사와 탄소연대측정 결과를 통해 운석 충돌로 약 5만년 전에 생성된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임을 밝혀냈다.
백악기 후반 집중적으로 발생한 운석 충돌, 공룡의 대멸종, 포유류의 등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선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번 연구는 운석 충돌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다른 충돌구를 탐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참고 자료
Nature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2025), DOI: https://doi.org/10.1038/s43247-025-02274-5
Meteoritics & Planetary Science(2021), DOI: https://doi.org/10.1111/maps.13711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1600
1600
 유리조나탄
유리조나탄
 1500
1500
 토르왕
토르왕
 1500
1500
 미국거주펨붕
미국거주펨붕
 1400
14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