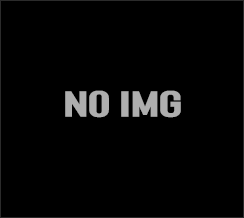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에서 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한 직장인 진모(38)씨는 반년째 같은 빌라 주민들에게 읍소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은 받았지만 다가구주택 거주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피해자가 나머지 주민 동의를 직접 얻어내야만 구제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진씨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제집만 낙찰받고 싶은데, (주민 중) 청약에 당첨돼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 안산시 인근에 사는 베트남 국적자 A씨(35)도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 이사를 가야 하지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동료 집을 전전하고 있다. 내국인 피해자는 디딤돌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인 A씨는 대부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행 신용대출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 전세사기를 당한 줄도 몰랐다”면서 “간신히 피해 인정은 받았지만 지낼 곳도 못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자까지 나온 지 1년가량 지났지만 피해자 중 절반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모두 1만400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나 저리대출 등 국토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프로그램 16건의 혜택이 미친 사례는 7688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54.9%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사례를 피해 회복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정부가 생각하는 ‘구제’의 정의가 다른 탓이다. 정부는 대출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착수를 구제 건수로 보는 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가 이뤄져야 비로소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여긴다. 그런데 보증금 회수가 되는 지원책은 우선매수권 활용과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등 2개 프로그램뿐으로, 지난달까지 298건만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제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면서 “피해자는 돈을 다 돌려받는 것만이 구제라고 보지만 대출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2100
2100
 우로스써보세요
우로스써보세요
 2000
2000
 풀카
풀카
 1900
1900
 블리자드직원
블리자드직원
 1900
19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