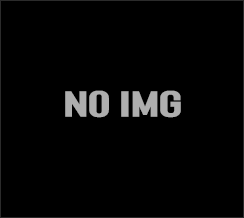장기 이식 ‘게임체인저’ 기대
줄기세포 활용 ‘혼종 장기’ 실험
면역 거부 부작용 등 해결해야
뇌-생식세포 등 윤리적 문제도

게티이미지코리아
쥐, 돼지 등 동물에 인간 세포를 주입해 인간 세포를 품은 장기를 키운 연구 성과가 최근 잇따라 공개됐다. 인간과 동물의 세포가 섞인 장기인 이른바 ‘키메라 장기’ 개발 연구다. 아직 도전적인 생명공학기술 분야지만 최근 연구에 속도가 붙는 추세다.
키메라는 사자 머리, 염소 몸, 뱀 꼬리를 가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생물종의 세포가 섞인 키메라 장기를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서다. 이식 가능한 인간 장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키메라 장기는 장기 이식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과 동물 세포를 융합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인간의 뇌세포와 생식세포를 동물에게 주입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크다.
● 키메라 신장, 심장, 뇌, 장, 간 가진 동물 탄생
이달 11∼14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키메라 장기 연구들이 발표돼 큰 화제를 모았다. 아직 정식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들이지만 획기적인 연구 성과로 이목을 끌었다.
라이량쉐 중국과학원 광저우바이오의과연구원 교수 연구팀은 인간과 돼지 세포가 섞인 키메라 심장을 만들고 연구 결과를 연례회의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돼지 배아에서 돼지 심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하고 인간 줄기세포를 주입했다. 인간 세포 유래 심장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돼지 배아는 대리모 돼지의 자궁으로 옮겨져 최대 21일간 생존했다. 돼지 배아는 생존 기간 인간 세포를 포함한 심장을 품었다.
연구팀은 돼지 배아 심장에서 인간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연구팀이 개발한 돼지 배아 신장에는 인간 세포가 최대 60% 포함돼 있었다. 연구팀의 키메라 장기 제작 방식은 한계점이 있다. 배양 접시에서 돼지 배아를 배양하고 인간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선시링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암센터 교수 연구팀은 배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간 조직을 이용해 뇌, 장, 간 오가노이드(유사 장기)를 만든 다음 오가노이드에 인간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임신한 암컷 쥐의 양수에 주입했다.
암컷 쥐 배 속에 있는 초기 단계 배아에 오가노이드를 직접 주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가노이드는 며칠 만에 쥐 배아로 스며들었다. 배아로 들어온 장 오가노이드는 배아의 장으로 성장했고 간과 뇌 오가노이드 역시 각각의 장기로 성장했다.
암컷 쥐는 출산도 성공했다. 연구팀이 태어난 새끼 쥐의 장 세포를 살핀 결과 약 1%는 인간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간과 뇌는 인간 세포 비율이 더 낮았다. 쥐의 간에서 인간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알부민’이 만들어지면서 키메라 간이 인간의 간처럼 부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인간 세포와 쥐 세포가 융합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키메라 장기에서 인간 세포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 인위적인 종간 교배는 우려
키메라 장기 연구는 장기가 망가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다만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종장기(다른 종의 장기)를 직접 이식하는 것보단 덜 할 수 있지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동물 배아에 주입한 인간 줄기세포가 원하는 장기로 제대로 분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인간의 뇌세포와 생식세포 주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간 뇌세포를 동물에 주입한다는 것은 동물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간화된 동물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
생식세포 주입도 우려가 크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물과 인간 세포가 결합된 잡종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라이 교수는 13일 ‘오가노이드 디벨로퍼 콘퍼런스’에서 “기술적으로 인간 줄기세포에서 뇌 신경세포와 생식세포 관련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안전성을 높인 키메라 장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태산희님
태산희님
 2600
2600
 학입니다
학입니다
 2400
2400
 풀카
풀카
 2200
2200
 비가오는날
비가오는날
 1800
18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