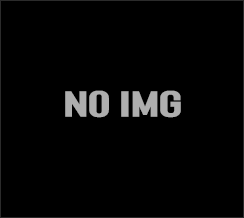죽음 이야기 다룬 '천국보다 아름다운'·'내가 죽기 일주일 전'
드라마 감독·철학과 교수가 바라본 죽음 소재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숙이 30대 모습으로 젊어진 남편 낙준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JTBC 캡처
'죽음'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많은 작품들이 사후세계를 그리거나 저승사자를 주요 캐릭터로 내세우며 상상력을 자극했다. 묵직한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콘텐츠도 있었다.
최근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숙(김혜자)이 30대 모습으로 젊어진 남편 낙준(손석구)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도 지난달 베일을 벗었다.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세상을 등지고 청춘을 흘려보내던 희완(김민하) 앞에 첫사랑 람우(공명)가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며 호평을 받았다.
이전에도 많은 작품들이 죽음, 사후세계 혹은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이재, 곧 죽습니다'는 이재(서인국)가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MBC 드라마 '내일'은 저승사자들을 주요인물로 내세웠다. 죽은 자를 인도하던 이들은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김혜영 감독이 바라본 죽음 이야기의 의미
콘텐츠 속 죽음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감각적인 연출로 사랑받은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김혜영 감독은 본지에 "삶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 일상이며, 누구나 겪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영화의 소재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사건을 구성한다. 죽음의 이유에 따라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이야기가 나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김 감독은 시청자가 인물을 통해 슬픔, 안타까움, 아픔을 느끼고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결말에 이르렀을 때 삶의 의미, 인관관계의 의미 등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넘어선 의지를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작품들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 앞에 위로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드라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감독 역시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을 통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겪었던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
대중은 왜 죽음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세상을 등지고 청춘을 흘려보내던 희완 앞에 첫사랑 람우가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며 호평을 받았다. 티빙 제공
죽음을 소재로 하는 많은 작품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왜 인간은 죽음에 대해 궁금해할까. 서강대 철학과 서동욱 교수는 "죽음은 필연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와해시키는 폭력으로 생각한다. 삶에서 큰 사건인 만큼 만인이 관심을 가질 소재가 되고, 드라마 등 예술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성직자, 장례지도사 등이 아니라면 가족, 친지가 사망하는 것과 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음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콘텐츠 속 죽음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시각화하는 흔한 방식 중 하나가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의 유한성에 불만을 품어 죽음을 공포로 느끼는데, 드라마는 사후세계의 구현을 통해 대중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고 전했다.
생사학(生死學) 전문학자인 오진탁 한림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수용해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 가르침을 줄 만한 전문가들이 드물다. 의학적으로 심폐사, 뇌사 정도로만 다룰 뿐이다. 일상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드물기에 이러한 소재의 드라마,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영화가 흥미나 자극 위주의 죽음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등 심층적인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죽음은 일상에서 금시기되는 대화 주제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누구나 한번씩은 죽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잘 죽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콘텐츠가 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다. 죽음이 종교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작품이 지나치게 깊이 있게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대중문화 콘텐츠의 미덕인 재미를 잃을 수도 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혈마
혈마
 2200
2200
 비빔면김가루
비빔면김가루
 2200
2200
 풀카
풀카
 2200
2200
 태산희님
태산희님
 2100
21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