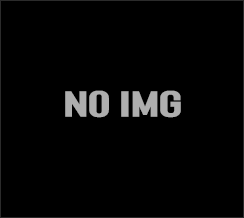곽노필의 미래창
1만2천광년 거리의 ‘행성 삼킨 별’
별 팽창 아닌 행성 궤도 붕괴 추정

천문학자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으로 행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 별 주변에 행성의 공전궤도가 만든 뜨거운 가스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나사 제공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년 후 중심부의 핵융합에너지가 고갈되면 점점 부풀어 오른다. 수소가 다 타버리고 헬륨만 남은 중심부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되는 동안, 바깥쪽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가 별의 외곽물질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별 표면이 넓어지면서 표면온도가 내려가 별빛은 적색으로 바뀐다. 이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수백배로 커진 별은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을 자신의 플라스마 안개 속으로 집어삼킨다. 태양의 경우 수성과 금성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태양 지름의 109배 거리에 있는 지구도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별에 가까운 행성들은 모두 이렇게 종말을 맞을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 미국 천문학자들은 1만2천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ZTF SLRN-2020라는 이름의 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의 빛은 수서~태양 거리보다 가까운 궤도로 공전하는 목성 크기의 ‘뜨거운 가스 행성’이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중심별에 삼켜질 때 내는 빛이라고 생각했다. 확인될 경우 수명이 다한 별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행성을 삼키는 장면을 목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후 미국 천문학자들이 이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역대 최고의 적외선 관측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임스웸우주망원경으로 이 별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런데 관측한 결과는 반전이었다. 연구진은 별이 행성을 삼킨 것이 아니라 행성이 스스로 별 속으로 빨려들어갔다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최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했다.

수백만년에 걸쳐 목성 크기의 행성이 별에 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 별의 대기를 통과한 행성은 점차 궤도가 좁아지다가 결국 별과 충돌하면서 고리와 푸른색 먼지 구름을 형성하는 물질을 방출한다. 나사 제공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반전의 데이터
이 별은 원래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마천문대의 ZTF(Zwicky Transient Facility) 망원경 관측을 통해 처음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처음엔 섬광처럼 번쩍이는 현상이 인근 백색왜성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일어나는 신성 폭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의 네오와이즈(NEOWISE) 망원경 관측을 통해 얻은 적외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미 그 1년 전에 별 주변에 적외선을 방출하는 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마치 수증기가 얼어 눈이 되듯,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별 표면의 뜨거운 가스가 식으면서 먼지가 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원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 뜻밖의 데이터를 보내왔다. 망원경의 중적외선과 근적외선 기기로 관측한 결과 이 별의 밝기는 적색거성보다 희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성을 집어삼킬 만큼 별이 팽창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제임스웹은 대신 별 주위에 고리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뜨거운 가스와, 가스가 식어 형성된 먼지 구름을 확인했다.

행성이 중심별을 향해 점차 소용돌이 모양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목성 크기의 이 행성은 중심별의 가스를 끌어당겨 우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가스는 식어 먼지가 된다. 나사 제공
별의 중력에 의한 조석 현상 결과인 듯
연구진은 이런 모습은 수백만년에 걸쳐 행성의 공전 궤도가 별에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재앙을 맞은 흔적으로 추정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모건 맥클레오드 연구원은 “행성이 별의 대기에 닿는 시점부터 별에 더 빠르게 떨어지는 폭주가 시작됐을 것”이라며 “행성이 별과 충돌해 별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바깥의 가스층을 벗겨내고 우리가 본 빛과 가스, 먼지 분자를 생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죽음의 소용돌이(나선)는 아마도 달이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조석 현상)을 만들 듯, 별의 중력에 의해 행성의 표면이 일그러지면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조석 변형이 누적되면서 행성 내부에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행성의 궤도 에너지 일부가 여기에 흡수돼 행성이 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중심별의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중심별과 행성의 상호중력에 의해 행성이 종말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관측 결과도 아직은 가설이다. 연구진은 앞으로 제임스웹망원경의 다른 파장에서도 이 별을 관찰해 먼지 구름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면 새로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 정보
Revealing a Main-sequence Star that Consumed a Planet with JWST.
DOI 10.3847/1538-4357/adb429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