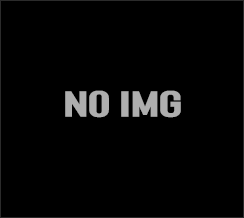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한일 벚나무 논쟁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
“원조 밝히는 논쟁 의미없어” 주장도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본격화된 제주 자생 ‘왕벚나무’의 전국 보급 운동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는 ‘왕벚프로젝트 2050'을 지난 18일 신구대학교식물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왕벚프로젝트 2050’는 오는 2050년까지 전국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특산종 ‘소메이요시노’ 벚나무를 제주도, 해남 등지에서 단 200여 그루만 자생하는 왕벚나무로 대체하는 캠페인이다. 생태학자 신준환 전 국립수목원장을 필두로 원예전문가, 독림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신준환 전 원장은 “진해·경주·구례·군산 등 벚꽃 명소는 물론 국회의사당과 현충원, 왕릉, 유적지 등에 있는 벚나무 수종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왕벚나무 묘목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NYT는 29일(현지시간)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한국 벚나무의 기원은 100년간 벌어진 민족주의 선전전과 식물의 유전적 진화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소개했다.

NYT는 일본에서 벚꽃이 17세기 이후 국유화되며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문화적 세련미를 심어주기 위해 소메이요시노 벚나무를 심었다고 밝힌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도 덧붙였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에 반발한 한국인들이 해방 이후 한때 벚나무를 대거 잘라내기도 했으나, 한일 양국이 수교한 1960년대 이후 소메이요시노 벚나무가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한국 자생종 왕벚나무는 새싹에 털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산 벚나무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명지대·가천대 연구팀은 유전체(게놈) 분석을 통해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종이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제주 왕벚나무는 한라산 자생 올벚나무(모계)와 산벚나무(부계) 사이에서 탄생한 자연 잡종이다. 반면 일본 왕벚나무는 올벚나무(모계)와 오오시마 벚나무(부계) 사이의 인위적인 교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NYT는 벚꽃에 대한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주장이 정치화하며 과학적인 시각을 도외시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와이비 쿠이터트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는 “왕벚나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종이 아닌 잡종 집합을 의미한다”며 “잡종과 잡종 사이에서 게놈 서열이나 DNA 샘플링으로는 원조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곽가봉효
곽가봉효
 800
800
 논현동똥식이
논현동똥식이
 800
800
 여수짱똥깨
여수짱똥깨
 800
800
 킹밥
킹밥
 700
7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