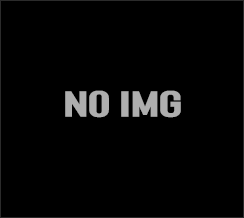日연구진, CT처럼 백악기 암석 내부 화석 입체로 구성

1억6600만년 전 멸종된 오징어의 친척 '벨렘노테우티스 안티쿠스'의 화석./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오징어는 언제부터 바다에서 번성했을까.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다. 오징어처럼 몸이 부드러운 생물은 화석으로 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견된 오징어 화석 대부분은 4500만년 전 이후의 것이었고, 그나마 오징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미세한 기관인 ‘스타톨리스’뿐이었다.
일본 홋카이도대와 싱크로트론 방사선 연구소가 ‘디지털 화석 채굴’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1억년 전 오징어의 역사를 밝혔다고 27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일본에서 발굴한 중생대 백악기(1억4600만년에서 6600만년 전)의 탄산염 암석을 1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내 두께로 깎으며 각각의 평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겹쳐 디지털로 암석 전체를 입체로 구현했다. 그 결과 암석 속에 있어 보이지 않던 고대 오징어 입 부분의 화석 263점을 3차원(입체)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화석의 입체 영상을 만든 것은 마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찍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CT는 인체를 수백 장의 고해상도 평면 X선 영상으로 나눠 찍는 방식이다. 각각의 X선 영상은 조직 단면을 보여준다. 이를 모으면 인체 내부를 입체로 볼 수 있다.
CT로도 암석 안의 화석을 입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흑백이다. 반면 이번 방식은 실제로 암석을 연마하면서 평면 영상을 찍고 합친 것이어서 컬러 입체 영상을 제공했다.
화석들이 발견된 암석은 약 1억~7000만년 전 지층의 것으로, 오징어가 백악기 초·중기부터 이미 다양하게 진화했고 생태계의 주요 포식자로 군림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전까지는 초기 화석이 없어 오징어가 6600만년 전 공룡 멸종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번성했다는 가설이 유력했지만, 이번 연구로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졌다.

그래픽=손민균
연구진은 “같은 시기를 살던 연체동물인 암모나이트나 물고기의 조상보다 오징어가 더 크고 흔했으며, 이미 그때부터 오징어가 지능적이고 빠른 포식자로서 바다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오징어의 두 주요 그룹인 오에고프시다(Oegopsida)와 미옵시다(Myopsida)가 각각 기존보다 1500만년, 5500만년 더 이른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에고프시다는 원양성 오징어, 미옵시다는 연안성 오징어다. 오에고프시다는 지금과는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지녔으나, 미옵시다는 이미 현대 오징어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이바 야스히로 홋카이도대 교수는 “화석 연구는 그간 실물 표본에만 의존해 접근성과 재현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연구에서 채굴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다”며 “이 방식이 연구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Science(2025), DOI: https://doi.org/10.1126/science.adu6248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여수짱똥깨
여수짱똥깨
 2600
2600
 입힌사탕
입힌사탕
 2400
2400
 태산희님
태산희님
 2300
2300
 구마이노베이션
구마이노베이션
 2200
22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