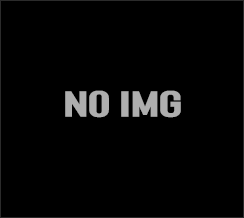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젖은 신발도 못 벗고, 하루 종일 죽을 맛.”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직장인 A씨는 “우산을 써도 소용없더라”며 “신발까지 푹 젖었는데 냄새날까 봐 벗지도 못하고 종일 찝찝한 채 일했다”고 토로했다.
기습폭우 등 천재지변에 필요한 게 유연근무제다.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선택하는 근무방식.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근무문화다.
문제는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다는 데에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워라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의 어깨가 젖어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ned/20250620155831028bkfx.jpg)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의 어깨가 젖어있다. [연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1.5%를 기록, 대기업(36.6%)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은 더 크게 낮아졌다. 1∼4인 기업은 1.4%, 5∼29인 기업 9.3%, 30∼299인 기업 20.3%를 각각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ned/20250620155831294lqxs.png)
기업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유연근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확산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연근무제가 늘었다가 최근엔 다시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 차가 크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대기업의 29.7%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코로나 정점을 이룬 2021년엔 42.6%까지 증가했다. 이후 작년엔 36.6%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2019년 8%에서 2021년 12.9%, 작년엔 11.5%를 기록했다. 코로나 전인 2019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6.9%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3.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를 거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유연근무제 도입 비중 추이[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ned/20250620155831472myob.png)
유연근무제 도입 비중 추이[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부적으로도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저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3%), 시차 출퇴근제(3.6%), 선택적 근무시간제(1.8%), 탄력적 근무제(2.6%), 재택 및 원격근무제(1.2%) 등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도 못 미쳤다.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내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노사 간에 근로시간이나 근로문화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적으로 인력난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으로선 유연근무제 등이 인력 유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채용 공고를 낸 ‘코니 아기띠’로 유명한 스타트업, 코니바이에린은 100% 재택근무제를 유지하고 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B 대표는 “사무 공간이나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재택근무가 회사에 나쁜 것만도 아니다”며 “요즘 젊은 직원은 특히 재택근무 여부에 더 민감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미국거주펨붕
미국거주펨붕
 2000
2000
 대단하다축리웹
대단하다축리웹
 1900
1900
 태산희님
태산희님
 1900
1900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1900
19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