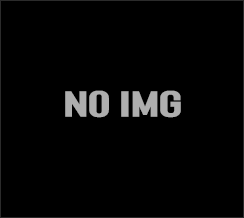이승재 KAIST 교수
정부, R&D 장기투자 하고
창의적 도전 지원해줘야
◆ 한국을 바꿀 10개의 질문 ◆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세포' 단위의 생로병사를 연구해왔다. 이제 막 '개체' 수준의 역노화 연구가 시작될 참이다. 현실계에서도 거꾸로 나이 드는 생물이 있을까. 있다면 그 개체를 연구해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승재 KAIST 교수는 "작은보호탑해파리나 바닷가재, 벌거숭이두더지쥐 등 몇몇 생물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작은보호탑해파리는 사고를 당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 한 죽지 않고 계속 자라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젊어져서 유생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먹을 게 생겨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성체로 자라나 번식한다. 사실상 불로불사인 셈이다.이 교수 연구팀은 예쁜꼬마선충에서 특정 리보핵산(RNA) 조절 단백질이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팀은 수컷과 암수한몸(자웅동체) 두 성별이 있는 예쁜꼬마선충의 특성을 이용해 성별에 따른 면역력 차이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작년 7월 국제 학술지 '오토파지'에 게재됐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비결은 식이제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 비밀을 밝히는 데 도전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인 기초연구 지원과 기업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역노화 산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미국 알토스랩스, 캘리코, 유니티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간을 대상으로 역노화와 항노화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아직 기술 응용과 민간 투자에서 격차가 큰데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토스(아마존)와 캘리코(구글), 유니티(페이팔)는 모두 빅테크 창업자가 만든 회사다. 이 교수는 "각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역노화 연구를 '정해진 미래'로 보는 것 같다"며 "빅테크와 인공지능(AI) 다음의 메가 트렌드는 헬스케어와 역노화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미국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노화연구소와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ARPA-H 노화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에도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해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성과가 연계 연구와 민간의 후속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응용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 인재들에게 과학 발전이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역노화 연구의 의미에 대해 강조해 달라고 했다. 그는 "역노화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질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백질 하나, 유전자 하나로 모든 걸 바꿀 순 없지만 다양한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퍼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결국 노화를 이해하고 미래 건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신찬옥 과학기술부장(팀장) / 이상덕 기자 / 원호섭 기자 / 추동훈 기자 / 김지희 기자 / 고재원 기자 / 최원석 기자 / 심윤희 논설위원 / 박만원 논설위원 / 김병호 논설위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