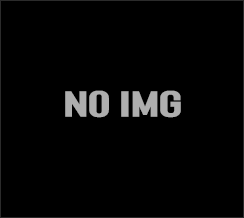이병철 前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그룹 중국 본사에서 15년 근무한 이병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최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박성원 기자
중국이 최첨단 AI 반도체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AI 칩 ‘H20’ 대신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이 만든 칩으로 AI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5년부터 15년간 삼성그룹 중국 본사에서 근무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를 지켜본 이병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최첨단 기술 경쟁을 벌일 정도로 발전한 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최근 아주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속 기업 외교’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병철 박사는 “중국이 2000년 초부터 자주창신(自主創新)이라는 구호하에 기술혁신 노력을 해 왔다”며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 총력전을 펼쳤고,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풍부하고 수준 높은 기술 인력, 방대한 시장 그리고 끊이지 않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결합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기술 굴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반도체 위기 이제 시작”
- 최근 미국의 수출 통제가 더 강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의 강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비롯 AI, 양자 등 신기술 분야에서 인해전술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예컨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기업이 12만곳 신설됐고, 특히 2020년 2만3111곳, 2021년 4만7392곳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엔비디아’라는 비렌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설계 분야에서 이미 엔비디아에 근접할 만큼 성능을 보이고 있고, 주요 반도체 장비의 중국 국산화율도 35%를 넘었다. 반도체 장비 분야 발전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
-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이 있다
“지난해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CXMT, 낸드플래시 창장메모리(YMTC)는 생산 능력과 수율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메모리 시장의 한국 주도권을 이미 위협하기 시작했고, 범용 메모리는 이미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국이 특정 산업에서 기반을 잡으면 기존의 주도 기업의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결국에는 도태되는 경우를 많았다. 최근에 LCD 산업이 그랬고, 이제 반도체가 그 다음 차례일 수 있다.”
- 논문에서 기업 외교를 강조한 이유는
“대부분 국내 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 기업 외교 역량이다. 기존 대관 업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예방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 값싼 반도체를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해외에서 중고 반도체 장비를 들여온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반도체 중고 장비까지 포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중 R&D 격차 크게 좁혀져”
-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세 번 접히는 스마트폰도 출시했다.
“치열한 성과주의 시스템과 역동적 기업 문화 영향이 크다. 화웨이는 사원이 입사하면 야전 침대를 선물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주문하고,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40대 중반에 은퇴할 정도로 인력 순환이 빠르고, 회사에서는 은퇴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줘 평생 먹고살 정도로 배당금을 받게 해준다. 화웨이는 작년에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휴대폰과 자율주행차 설루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화웨이의 트리플 폴더블폰 '메이트 XT'./바르셀로나=김민국 조선비즈 기자
- 중국 엔지니어들과 일해 보니 어땠나.
“중국은 엔지니어가 넘쳐 난다. 대학 졸업생 1200만명 중 엔지니어가 500만명이다.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같이 일해 본 중국 엔지니어들은 거침없이 토론하고 열정적이었다. 이 친구들이 제대로 감 잡으면 한국은 물론 미국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이 됐다.”
- 중국의 ‘기술자립론’도 현실이 됐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 자립은 핵심 경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미국과 격차가 빠르게 줄었다. 산업 전체 기술 수준은 2020년 중국이 미국 대비 80%로 2015년(70%)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R&D비 역시 2015년엔 미국의 28.7%에 불과했지만, 2020년 53.2%까지 상승했다.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줄었을 것이다. R&D 인력의 경우 중국은 2020년 이미 228만명에 달해 미국(158만명)을 크게 앞질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풀카
풀카
 1600
1600
 우로스써보세요
우로스써보세요
 1500
1500
 그랑프리옥황상제
그랑프리옥황상제
 1400
1400
 풀카
풀카
 1400
14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