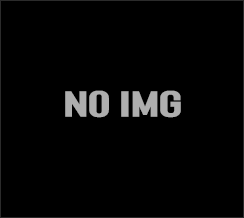한국뇌졸중등록사업단 팩트시트
10명 중 8명은 3시간 내 병원 도착 못해
병원 치료 시간 줄였는데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팩트시트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환자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한번 손상된 뇌 신경세포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뇌경색 환자가 장애를 갖지 않고 퇴원하려면 증상이 나타난 지 4시간 30분 안에는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지침이다. 뇌경색 환자는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도 최근 10년 간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뇌졸중등록사업단이 발간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환자의 24%만이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2014년24.7%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환자의 대다수인 67.3%는 3시간30분 이상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환자등록사업단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뇌졸중 환자 17만1520명 가운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으로 입원한 15만 3324명(89.4%)의 치료부터 예후까지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사업단이 매년 연례보고서를 냈지만, 10년치 자료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뇌졸중 환자는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2%만 시간 안에 혈전용해제(tPA)를 투여 받았을 정도로 치료가 늑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응급실에 뇌경색 환자가 들어오면 60분 안에 정맥에 혈전용해제(tPA)를 받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도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병원 안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병원 안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자가 치료를 받을 병원으로 데려오는 단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송하는 속도는 평균 26분으로 비교적 빠르다. 문제는 이렇게 도착한 병원에 병상과 적정 의료진이 없어서 생기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서 나타난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 10명 중 2명은 첫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이런 상황은 지방이 더 심각하다. 지역별로 전남 44.6%, 광주 34.5%, 충남 30.4%, 경남 29.5%의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원 과정에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연락해서 환자를 옮겼다가 다시 C병원, D병원으로 옮기면서 시간 낭비가 컸다. 병원을 한 번 옮기는 데만 최소 2시간씩 지연된다는 것이 의료진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각 지역의 7개 병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단체톡방)로 묶고 뇌졸중 환자가 권역에 생겼을 때 단체톡에 환자 정보를 올리면 치료 가능한 병원에게 곧장 연결해 주는 식이다. 인적 네트워크에는 대동맥박리 환자도 포함됐다.
이경복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해외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응급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며 “병원 전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인적네트워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려면 구급대 교육과 구급대 연결까지 의료진들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담당 의사가 권역센터 당직을 하고 다음 날이면 또 외래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환자에게 혈관용해제를 투여하거나, 혈전제거수술을 실시하는 건수는 2012년 1035건에서 2022년 1613건으로 늘었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했으나, 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상태에서 퇴원한 비율도 같은 기간 39.7%에서 44.1%로 4.4%p(포인트) 늘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미국거주펨붕
미국거주펨붕
 1800
1800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1600
1600
 노익스플로드
노익스플로드
 1600
1600
 대단하다축리웹
대단하다축리웹
 1600
16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